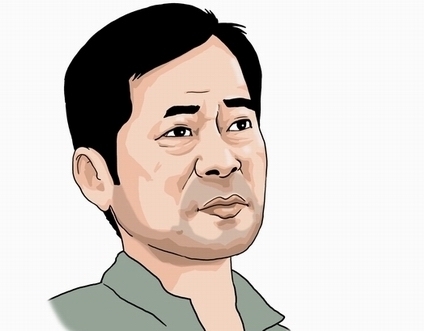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했던 지난 6월29일 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아직은’ 이란 칼럼을 통해 ‘윤 전 총장은 10여 년 동안 사고의 외연을 넓히고 대권에 도전하라’고 권고했다.
그 이유는 권력기관 혹은 권력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조직에 오랜 기간 동안 근무했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패거리 문화에 함몰되어 딴따라, 즉 우물 안 개구리식 사고로 무장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필자의 경우를 실례로 들어보자.
필자는 정당판을 떠나 소설가로 변신하면서 작고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인간이었다고 공개 고백한 적 있다.
이 대목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하리라 판단한다.
그러나 필자는 어리석게도 정당판에 적을 두고 있던 동안에는 단 한 번도 그를 인간으로 여긴 적이 없었다. 물론 그 판을 떠난 바로 직후에도 그랬다.
그는 그저 단순한 정적 나아가 반드시 타도해야 할 대상에 불과했다.
정당에 있던 시절 필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그와 대척점에 서며 그에 대해 항상 부정적으로 바라본 결과로 필자도 모르는 사이 추악하게 변해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문학인으로 변신한 시점에 그 사실을 깊게 자각하고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됐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의 경우 필자보다 더욱 위험하다. 기형의 권력기관인 검찰에서 근 30년을 오로지 지냈다는 점 때문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했는데 윤 전 총장은 강산이 세 번 바뀔 동안 검찰이란 한 우물만 팠다.
그는 뼛속까지 검찰로 그의 정신세계는 오로지 검찰의 일만 존재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그가 대선 출마 이후 내놓은 언행 몇 가지만 실례로 들어보자.
‘돈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먹어야 한다’ ‘사람이 손발로 노동하는 건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것이다’ ‘집이 없어서 주택 청약을 못 만들었다’ 등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실언이라 표현했으나 이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다.
검찰 일 이외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즉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기본사항도 모른다.
한마디로 이 사회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최근의 사례 두 가지를 더 들어보자.
먼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참패한 결과에 대해 당시 당 대표였던 홍준표 후보에게 강력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당시 그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파격의 성은을 입고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당시 그의 임명을 두고 필자는 물론 다수의 사람은 문 대통령과 윤 전 총장은 공동운명체가 됐다고 여겼다.
마치 그를 입증하듯 그는 다시 파격으로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결국 그의 질타는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다.
다음은 그의 손바닥에 적혀 있던 왕(王) 자에 대해서다.
논란이 일자 그의 캠프는 “손바닥에 적힌 것은 이웃에 사는 아주머니께서 매직으로 써준 것”이라며 “손 세정제로 지우려고 했는데 안 지워졌다”고 해명했다.
그가 입만 열면 외쳐대는 국민, 즉 민(民) 자가 아닌 ‘王’자가 쓰인 것도 그렇지만 지우려고 했는데도 지우지 못했다는 변명은 명백한 국민 우롱 행위다.
보통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윤 전 총장과 그의 측근들의 언행을 살피면 망가지려고 작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 일어난다.
그런 측면에서 윤 전 총장은 혹시 국민의힘 측 페이스메이커가 아닌가 하는 의혹 일어난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