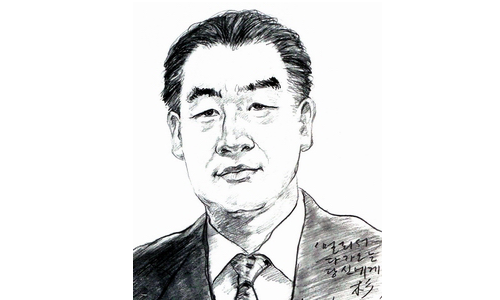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할 때, 청년용 교통카드를 찍으면 기계가 ‘청년’이라고 말한다. 짧은 음성이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멈춘다. 그 단어 속에 한국 사회의 청년에 대한 기대와 미래가 불안한 청년의 모습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재명정부는 청년정책에 적극적이다. 주거·금융·창업·교통까지 전방위로 지원책을 내놓는다. 그러나 표면적으론 청년을 위한 시대가 열린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청년들이 느끼는 체감은 다르다. 정부가 청년을 외치는 데 익숙하지만,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데는 서툰 것 같다.
정부의 청년정책이 진정으로 성공하려면, 경제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청년이 스스로 연결되고 배우는 사회적 인프라, 즉 지역 교류, 국제 교환, 유스호스텔 같은 공공 플랫폼에 대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
최근 정부의 청년정책을 보면 모든 정책의 키워드에 ‘청년’이라는 단어가 붙는다. 청년 일자리, 청년 주거, 청년 미래 같은 정책이 그렇다. 그런데 정작 청년이 모이고 교류하는 공간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정부가 말하는 청년은 숫자나 통계로는 존재하나, 현실의 청년은 공간 없이 흩어져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유스호스텔이다. 한때 전국 곳곳에서 청소년과 대학생의 교류를 이끌던 유스호스텔은 지금 방치 상태에 가깝다. 청년정책이 복지나 취업 지원에만 쏠리면서 청년이 스스로 배우고 연결되는 플랫폼으로써 유스호스텔 기능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
정부가 ‘데이터 기반 청년정책’에만 비중을 두면서 ‘관계 기반 청년정책’은 뒷전으로 밀린 것이다.
유스호스텔은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다. 세대와 지역을 잇는 사회적 인프라다. 그곳에서 이뤄지는 자원봉사, 교류, 국제협력 프로그램은 돈보다 값진 경험을 만든다. 그런데 이런 기관이 행정적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은 정부의 청년정책이 여전히 청년을 ‘대상으로만’ 보고 있음을 드러낸다.
정부가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다면, 그들이 함께 모이고 성장할 수 있는 구조부터 살펴야 한다. 청년이 교류하지 않는 사회는 미래를 잃은 사회고, 이미 늙은 사회다. 유스호스텔 외면은 곧 청년정책의 빈틈이다. 이 작은 공간의 불이 다시 켜질 때, 청년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
유스호스텔이 지난 반세기 동안 쌓아온 사회적 자본은 여전히 유효하다. 청소년 수련, 국제교류, 봉사활동 같은 프로그램을 복원한다면, 오늘의 MZ세대에게도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되살릴 수 있다.
청년이 지역을 여행하고 지역이 청년을 맞이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관광정책이 아니라 세대와 지역을 잇는 사회정책이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리모델링’이 아닌 ‘리바이벌’이다. 청년 교류의 불이 다시 켜져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도 지방시대에 맞는 청년정책을 내세워야 한다. 지금 지방에는 청년이 없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멈추지 않고, 지역의 숙박·교류 인프라는 노후화됐다.
이제 각 정당이 청년의 교류를 정책의 중심에 놓고 지역의 유휴 유스호스텔을 청년 체류형 거점으로 전환하는 공약을 해야 한다. 여행과 일, 학습과 교류가 결합된 모델 말이다. 청년이 지역에 머물며 현안 문제를 함께 풀고, 외국인 청년이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지방은 다시 젊어질 수 있다.
지난 16일 만난 고석천 한국유스호스텔연맹 사무총장은 “지방시대의 성공은 인프라보다 인적 교류에서 시작되는데, 지방은 여전히 청년의 발길이 드물고, 청소년 교류의 거점도 사라졌다”며 “국제유스호스텔연맹 58개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 직영 유스호스텔이 없어 한국에서 각종 국제행사를 펼칠 수 없다”고 아쉬워했다.
고 사무총장은 “서울시가 3천만 관광객 시대 기반 마련을 위한 서울 관광인프라 종합계획에 따라 폐교 부지(공항고)를 유스호스텔로 전환해 2030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 공간을 한국유스호스텔연맹에서 직영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유스호스텔연맹이 이 공간을 직영한다면, 국내외 청년이 만나고 머무는 진짜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시설 리바이벌 비용부터 운영 인력 확보, 초기 수익구조 안정까지 모두 쉽지 않은 과제다. 서울시의 의지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기 어렵다. 결국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다. ‘청년기본법’이나 ‘관광진흥법’ 안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예산 지원과 세제 혜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해 폐교 부지가 청년의 공간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히 초기 운영을 연맹에 맡기되, 최소 3년간은 정부가 운영비 일부를 보조해 연맹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창업에만 예산을 쓸 게 아니라, 청년이 만날 수 있는 청년의 공간에도 투자해야 한다.
한국유스호스텔연맹이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준비한 ‘Gap Year(갭이어) 프로그램도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갭이어는 학교와 일터 사이에서 잠시 멈추고, 여행과 봉사, 학습과 탐색을 통해 자신을 재정비하는 시간이다.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원해 왔다. 청년이 잠시 떠나는 것은 공백이 아닌, 성장의 과정이다.
유스호스텔은 이 갭이어 제도의 거점이 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유휴 유스호스텔을 리바이벌해, 청년이 머물며 지역을 배우고 공동체와 교류하는 체류형 배움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하철 개찰구의 ‘청년’이라는 말이 반가우면서도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를 정부는 잘 헤아려봐야 한다. 제도는 존재하지만 청년의 삶은 여전히 정책 바깥에 있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지금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지원이 아닌 방향이고, 혜택이 아닌 공감이다. 그리고 일자리보다 일의 의미가, 정책보다 믿음이 더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