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국민을 통틀어 3명뿐인 직업이 있다. 이들은 전국을 3개로 쪼개 각 지역을 담당한다. 1명만 없어도 남은 2명의 부담은 배로 늘어난다. 백골이 된 사체의 신원을 밝혀내는 법의인류학자. <일요시사>가 박대균 순천향대 해부학교실 교수를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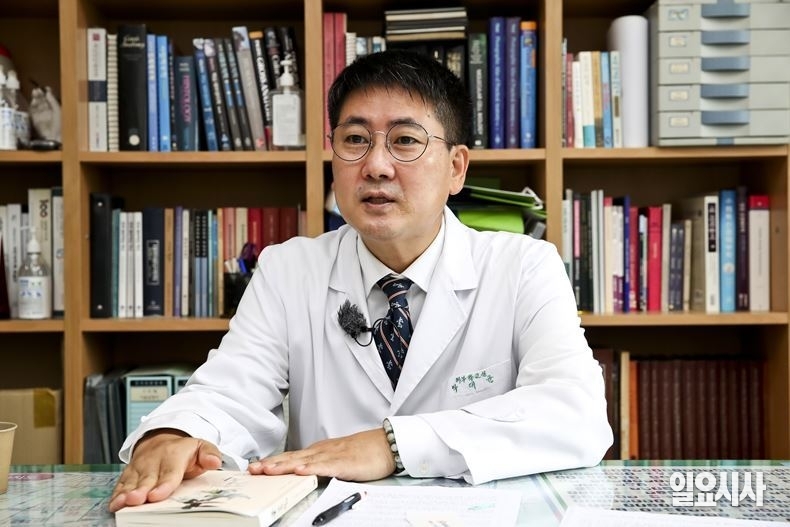
지난해 9월13일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에서 만난 박대균 교수는 코로나19를 심하게 앓았다고 털어놨다. 박 교수는 ‘태어나서 이렇게 아파본 적은 처음’이라고 했다. 그의 앞에는 <일요시사> 취재진이 사전에 보낸 인터뷰 질문지가 놓여 있었다. 질문지는 답변을 위한 기록으로 빼곡했다.
뼈가 하는 말
박 교수는 국내에 단 3명뿐인 법의인류학자다. 사망 이후 백골이 된 사체의 뼈를 통해 신원을 확인한다. 다른 2명은 가톨릭대 해부학교실에서 일하고 있다. 박 교수는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의뢰를 받는다. 백골화 된 사체가 발견되면 박 교수에게 연락이 오고 사람의 뼈로 판명되면 부검 등의 작업을 진행하는 식이다.
“법의인류학은 법의학이라는 큰 범주 안에 아주 작은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법의학을 1로 따지면 법의인류학은 1/16 정도입니다. 법의학자는 사망 이후 3일 이내 사체를 부검해서 사인을 밝히는 게 주 업무입니다. 저는 그 상황을 넘어선 부패가 심하거나 백골화된 시신을 부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뼈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성별, 사망 당시 연령대, 키, 생전 앓았던 질병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박 교수는 “예를 들어 100명의 백골화된 사체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럼 남녀를 구분해 먼저 50명으로 줄인다. 나이에 따라 또 줄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범위를 좁힌 후 실종자 가족 등의 유전자 정보와 대조해 신원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역으로 말하면 백골 사체의 유전자 정보가 나왔어도 대조하지 못하면 신원확인이 어렵다는 뜻이다. 박 교수는 실종자 가족이 유전자 정보 등록을 해서 백골 사체와 비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하는데 아직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여기에 백골 사체를 의뢰받아 부검을 진행해 정보를 제공해도 법의인류학자는 이후 상황을 알 수 없다.
전국서 3명뿐인 직업
백골 사체 신원확인
박 교수는 “백골 사체를 부검하고 감정하는 작업을 하다 보면 이후에 실제로 신원확인이 이뤄졌는지 굉장히 궁금하다. 하지만 수사기관으로부터 그런 정보를 받을 수 없어 짐작만 할 뿐이다. ‘잘 되셨을까?’ ‘잘 되셨겠지’ 정도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 사체의 신원이 밝혀지고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면 좀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텐데…”라고 말했다.
국내 법의학자는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참사 현장과 닿아 있다. 사고 과정에서 나오는 대다수의 사체를 부검하고 식별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 박 교수 역시 마찬가지다. 그는 가톨릭의대 학부생 때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접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공보의로 근무할 때는 대구지하철 참사가 발생했다.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일어난 방화 사건으로 192명이 사망했다.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였기 때문에 현장에는 살점이 거의 없는 백골화된 상태와 똑같은 사체가 대부분이었다. 박 교수를 비롯한 법의학자의 역할은 그 상태에서 사체의 신원을 파악하는 일이었다.
박 교수는 지하철에서 ‘붓질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마치 유적 발굴 현장에서 고고학자가 붓을 들고 조심스럽게 흙을 쓸어내듯 박 교수를 비롯한 법의인류학자는 조심스럽게 사체를 찾아냈다. 박 교수는 “‘사체 혹은 사체 조각은 현장에서 들어 올리는 순간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그렇기에 일단 그대로 둔 상태로 붓질을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머리, 목, 몸통,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를 찾아내면 비로소 사람 1명이 된다. 사진을 찍은 뒤에 순서대로 옮긴다.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유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신원확인이 이뤄진다. 작은 조각의 치아로도 개인식별이 가능하다. 사체에 남아 있는 소지품도 큰 역할을 했다.
작업을 반복한 끝에 142명의 미확인 사체 가운데 136명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6명 가운데 3명은 유전자 정보가 확인됐는데 대조할 가족이 없었고 남은 3명은 완전히 탄화돼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실제 대구지하철 참사 실종자 수는 6명으로 최종 집계돼있다.
박 교수는 “대구지하철 참사에 대해 말할 때는 유가족께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든다. 위로의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구지하철 참사는 법의학의 필요성과 국내 법의학 수준을 사회에 알린 사건으로 꼽힌다. 법의인류학자 역시 이 사건을 통해 그 역할이 알려지게 됐다.
많은 사람이 법의학을 ‘죽은 자’의 학문으로 여긴다. 사망한 사람의 몸에 남은 흔적으로 사인을 밝히고 감정하는 일이 주 업무기 때문에 산 사람과는 연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법의학자는 법의학이야말로 산 사람을 위한 학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대구지하철 참사 시신 발굴
감정 이후 상황 몰라 아쉬워
죽음이 주는 정보가 인간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법의학의 존재 이유는 망자의 인권을 지키고 사인을 밝히는 것도 있지만 이를 통해서 살아있는 사람의 삶에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죽은 사람이 건네는 정보를 통해 산 사람의 건강을 위한 정책을 만든다든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셈입니다. 예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박 교수는 현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사망 원인 등 들쭉날쭉한 통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로 든 건 변사자 통계였다. 경찰과 해양경찰에서는 매년 변사자 수를 파악해 공개한다. 국내 변사자 수는 이 두 기관에서 나온 수치를 합친 것이다. 1년에 3만명가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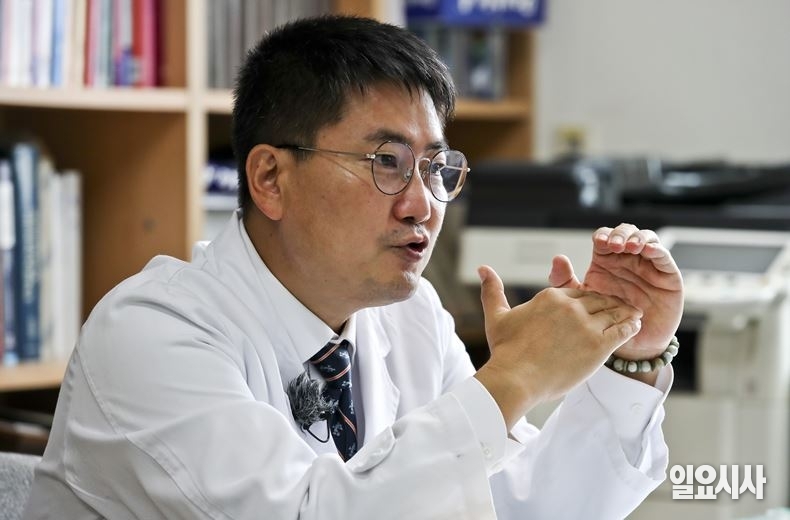
문제는 부검 수다. 3만명의 변사자 가운데 부검을 하는 경우는 8000~9000건 정도다. 법의학자는 변사자 가운데 부검을 하지 않은 2만여명에서 억울한 죽음, 확인되지 않은 죽음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박 교수는 “사인을 정확히 통계화할 수 없는 사망이 그 정도 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1년에 국내서 발생하는 변사자 수를 7만명 정도로 보기도 한다. 매년 최소 2만여명에서 6만여명의 부검하지 않은 변사자가 나오고 있는 셈이다.
박 교수는 “부검을 하고 망자를 통해서 사인을 확실하게 밝히면 좀 더 정확한 질병 통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사망 원인으로 이 경우가 제일 많으니 조심합시다’라는 예방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통계가 부족하다보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들어야 한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한 끝에 법의인류학자가 됐다는 박 교수. 그는 해부학을 전공하면서 뼈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후 법의학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를 찾다가 법의인류학의 길을 걷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체는 스스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의학자는 그 말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말을 맺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