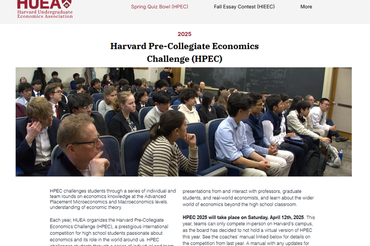범죄학은 범죄와 범죄자의 연구라고 정의할 수 있다. 범죄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감안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범죄학의 범위에 피해와 피해자의 연구도 포함돼야 함이 마땅하며, 피해자학의 중요성이 더해지는 것이다.
지금껏 피해와 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학계서조차도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무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사법 절차와 과정상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더 우려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피해자를 사법 정의의 주체적인 당사자로서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부각되고 있다. 학문적으로도 범죄와 가해자 중심에서, 피해와 피해자 중심과 지향의 사법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다.
여전히 피해자학적 관심이 필요한 분야가 있는데, 환경 범죄의 피해와 피해자가 대표적이다. 학문적으로는 ‘환경 피해자학(Environmental Victimology)’, 또는 ‘녹색 피해자학(Green Victimology)’이라고 한다.
환경 피해자학에서 말하는 피해와 피해자는 훼손되거나 오염된 환경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 인간과 비인간을 포함하는 환경적 피해는 물론이고, 피해자와 관련된 사회 과정과 제도적 반응을 검증하고, ‘환경 사법(Environmental Justice)’의 개념을 탐구하는 것을 환경 피해자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환경 피해자학은 환경 범죄와 그 위해의 피해와 피해자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 분야다. 당연히 각종 오염, 훼손, 기후변화 등 환경적 위해가 개인, 지역사회, 환경 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 검증하고 탐구하는 것이다.
인간이 피해자인 ‘환경 사법(Environmental Justice)’, 특정한 환경이 피해자인 ‘생태 사법(Ecological Justice)’, 동식물이 피해자인 ‘종의 사법(Species Justice)’ 등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이처럼 환경적 해악의 피해자는 비단 환경 자체만이 아니다. 어쩌면 환경적 해악의 중요한 피해자인 인간은 범죄의 피해자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비인간 환경 피해자는 피해자 범주에 속하면서도 거의 관심과 주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환경 범죄와 사법은 인간 피해자와 비인간 피해자를 모두 아우를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환경 정의가 주관적이고 때로는 스스로 규정한 피해자화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국가와 지도자들이 스스로 피해자화를 인식하지 않는다면 환경적 해악의 피해자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은 곧 인간 피해자와 비인간 피해자 사이에 긴장을 초래한다. 어쩌면 환경 정의가 아니라 ‘환경 부정의(Environmental Injustice)’를 초래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환경 피해자화는 인간의 경험만이 아니다. 환경 자체를 피해자로 기술하는 것이 대단히 추상적일 수 있지만, 인류가 야기한 심각하고 광범위한 해악을 무시하면 안 된다. 환경 범죄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환경, 생태, ‘종(Species)’이다.
인간 역시 피해자다. 환경은 그 자체가 환경 범죄의 1차 피해자인 반면 인간은 1차 피해자는 아니겠지만, 가장 큰 피해일 수 있다.
[이윤호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